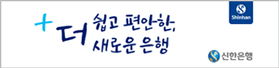정답은 없다
김풍배 칼럼

국제결혼 해서 사는 딸이 외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외손녀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히 프랑스 국적으로 지금은 둘 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국말과 한글을 익혀서 손녀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일류대학교에 다닌다는 소릴 아내에게 들었던 터라 프랑스의 교육제도가 궁금했습니다. 손녀들을 앉혀놓고 궁금한 것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공교육은 만 3세에 입학하여 5세에 졸업하고 초등학교는 6세에 입학하여 10세에 졸업하고(5년 동안), 중학교는 11세에 입학하여 14세에 졸업(4년간). 고등학교는 15세에 입학하여 17세에 졸업(3년간)합니다. 이는 학제만 다를 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으나 대학과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능시험과 같은 바칼로레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인 동시에 대학교 입학 자격을 제공하는 시험입니다. 바칼로레아는 다양한 트랙을 제공하는데 일반 바칼로레아 외에도 기술 바칼로레아, 직업 바칼로레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절대적인 건 아니어서 불합격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에콜’(직업전문학교), ‘그랑제콜’(특수 대학교), ‘위니베르시테’(정규대학교)와 같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대략 프랑스의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랑제콜을 가기 위해서는 ‘프레빠’라는 2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파리의 유명 대학 내 최상위 그랑제콜을 가기 전 밟는 제도라 했습니다. 학비를 거의 내지 않는 대신에 자격시험을 학년마다 실시하여 상위 단계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학할 수 있고 이때 많은 학생이 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급과 졸업이 매우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해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신입생의 약 8~90%가 탈락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입학보다는 졸업이 힘들고 우리나라처럼 너도나도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 해야 할 사람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자기 기준에 맞춰 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학생이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워서 경쟁시키지만, 프랑스에서는 1등부터 4등까지의 상위권 학생들만 경쟁시키는 모습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엘리트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존경심을 갖거나, 또는 노골적 혐오심 없이 그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처럼 수직적 관점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임금도 높고 복지도 잘되어 있어 엘리트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랑제콜 출신 엘리트가 되는 것도 ‘선택’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큰손녀는 내년에 의대 진학을 앞둔 ‘위니베르시테’ 3학년생이며 둘째는 그랑제콜을 준비하는 ‘프레빠’ 2학년생입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말이 허언은 아니었습니다.
손녀의 설명을 들으며 참 합리적 교육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적성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도 다른데 오로지 일류 대학의 진학을 위해 주입식 공부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과도한 사교육비로 등골 휘는 학부모의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프랑스 같은 제도가 좋을 듯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그런 말을 했더니 듣고 있던 딸아이가 발끈했습니다.
“아버지, 경쟁 없는 사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는 지금 계속 퇴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고 있는 건 그런 혹독한 경쟁으로 실력을 길렀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문득 미꾸라지 수입상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올 때 많은 수의 미꾸라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살펴봤더니 메기가 한 마리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미꾸라지 상자에 메기 한 마리씩을 넣었더니 모두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남겠다는 생의 본능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지 생각했습니다.